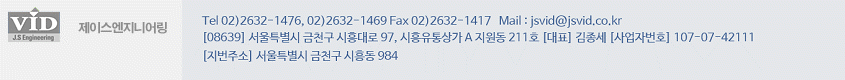들국화
김 태원
지금쯤 그 무덤에도
들국화 피었으리
윤 팔월 보름달밤
무더기로 피었던 곳
열아홉 피다 진 꽃
내가 고른 무덤 터
구절초라 뜯다보니
들국화 구절초라
세월속 두고 온 얼굴
어제인 듯 떠오르네
돌감나무 쌍묘등
이슬 내린 잔디밭
스무날 깨진 달
하늘 중간 떠있던 밤
창백했든 그 얼굴
죽거든 묻어줘
숨이 찬다 말 못 있던 이
살다보니 잊은 이름
들국화 일러주네
부산에서 삼년만에 고향에 돌아 왔다. 우물가에 못 보던 선녀 같이 아름다운 미인 처녀가 있었다.
알고보니 감나무집 고모 댁에 휴양 차 왔다 했다.
이 친구 저 친구를 통해 사귀게 되었다. 그녀도 나를 무척 좋와했다.
일 년쯤 지나다보니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차는듯하여 감기려니 생각했는데 결핵 3 기란다.
몸져눕게 되어 약 삼 개월정도 만나지 못했던 중, 전에 자주 만나던 쌍묘동에서 만나자는 전갈이 왔다.
만나보니 곱던 얼굴 어디로 가고 무서우리만치 창백했다.
말 한마디에도 숨이 찼다. 죽거든 묻어줘. 마지막 만남이었다.
삼일 후 영예가 죽었다고 수근들 댔다. 결핵이라 그 집에 가기를 꺼려했다.
생각다 못하여 우리집 일군과 친구 몇을 설득하여 지게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 날이 윤팔월 보름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들국화 꽃이 무더기로 피어 희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이곳에다 들국화 한복판에 착하고 고왔던 영예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 윤팔월 보름달 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