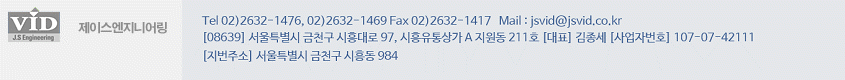울지 못하는 아픔
스산한 바람이 가슴을 움추리게 하고 있다.
뜰악을 구르는 낙엽은 바람결에 몰려 가고 몰려 오며
맴돌기를 거듭한다.
애써 가꾸어오던 국화의 꽃망울이 그 빛을 잃어가며 안간힘을 쓰듯
곁에 머물게 하여달라 애원해댄다.
하늘에 구름은 가을 하늘에 빨려들어가 깃털처럼 흩어지고 있다.
한동안 움직임을 멈췄던 걸음걸이를 재촉하며 자연의 애절한 호소를
외면하느라 표정조차 바꾸지 못한채 종종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세상에 나누어야 할 정조차 숨겨온 삶의 무게에
흠찟 놀래려다
그조차 무엇에 들키기라도 하였다는듯
애써 감추려 자리를 피하며 쓸쓸해 한다.
어쩌다 이토록 되고 말았나
차거운 가슴에 온기는 남은 것이며,
뜨거운 사랑은 어디 있는 것이냐?
노랗게 퇴색 되어가는 자신을 향해 자신이 묻고 있다.
이 공포에 질린듯한 하루 하루를 울지도 못하는
자화상은 언제부터 생긴 것이며
누가 이토록 몰인정한 냉혈한의 표정으로
탈출구만을 찾게 만들었단 말인가
하늘만은 피할 수도, 머물 수도, 내려 놓을 수도 없는
울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미친듯이 서성이는 모습을
애절하게 내려다볼 뿐이다.
사진 작가 : 김 성수 교수